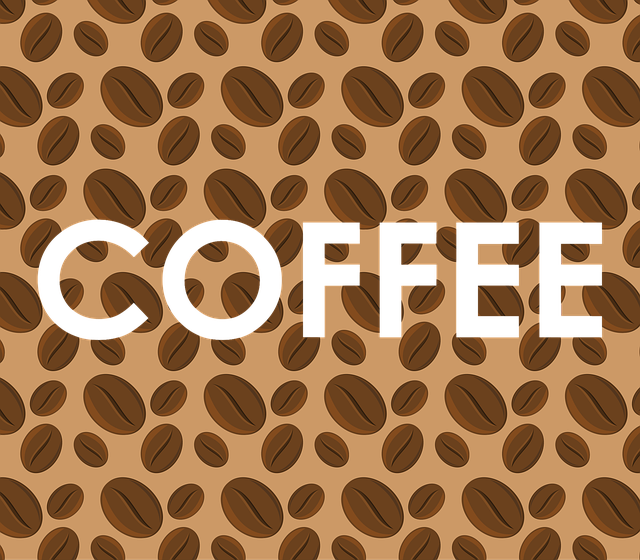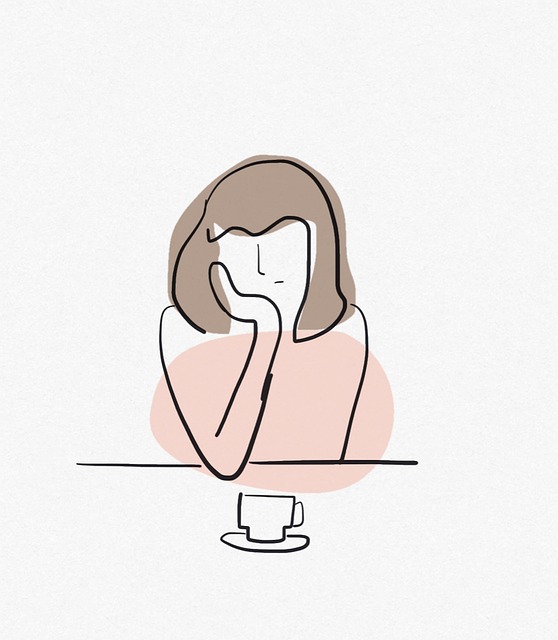빛나는 금박, 고급스러움의 상징 - 라벨 디자인에서 금박 처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급스러움과 희소성을 전달하는 상징적 장치였다. 특히 프리미엄 캔커피와 한정판 라벨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소비자는 금빛의 반짝임을 보는 순간 **‘이 제품은 특별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실제로 금박 라벨은 선물용 혹은 기념 한정판 제품에서 높은 선호도를 얻었으며, 이는 단순히 음료가 아닌 작은 럭셔리 아이템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메탈릭 효과가 주는 에너지와 현대성1990년대 후반부터는 메탈릭 라벨이 커피 캔 디자인에 자주 적용되었다. 반짝이는 금속성 효과는 에너지, 속도, 현대성을 상징하며, 특히 도시 직장인과 젊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메탈릭 라벨은 빛의 반사에 따라 다양한 톤을 보여주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