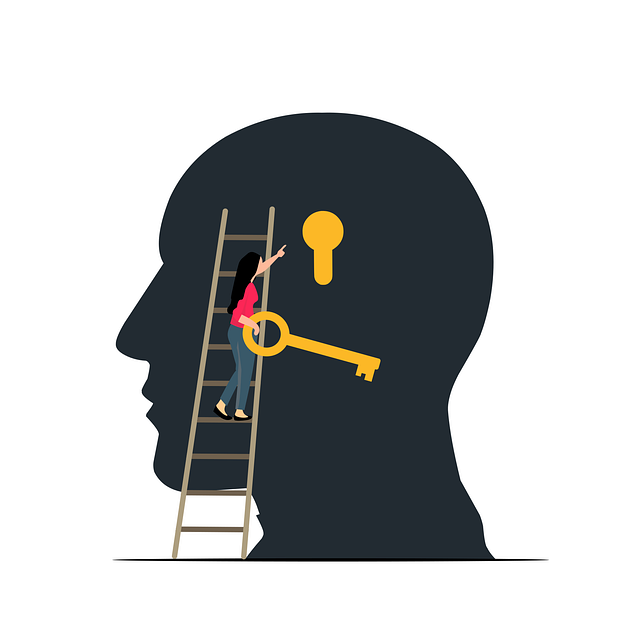유리병이 전하던 고급감과 신뢰 – 병 포장의 정체성1970~80년대 한국 음료 시장에서 유리병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신뢰와 고급감을 상징하는 매체였다. 유리병은 투명한 재질 덕분에 음료의 색과 질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고, 이는 소비자에게 “내용물의 질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유리의 묵직한 무게감은 제품 자체의 진중함과 정성을 상징했고, 병목에 붙여진 작은 라벨, 엠보싱 처리된 브랜드 로고, 금속 뚜껑의 질감까지 총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인상을 제공했다. 당시에는 유리병이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진짜 음료는 병에 담긴다”는 문화적 코드를 형성했다. 이러한 유리병의 정체성은 탄산음료나 쿨피스 같은 유제품 계열보다, 쌍화탕이나 맥콜처럼 전통성과 깊이를 강조한..